한 동안 아파트 뒷산에 있는 소쩍새가 시도 때도 없이 솥이 작다고“소쩍 소쩍”하고 울어댔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의 바람 골을 통과한“소쩍 소쩍”이“맘쩍 맘쩍”하며 사람들의 작아진 마음을 한탄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어인일일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린도후서 6:12-13).
소쩍새의 울음이 찬바람에 얼어붙자마자 온 동네가 까치의 울음소리로 뒤 덮였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를 개사하여 부르는 듯하다.“까치 까치설날은 오늘이고요 사람들의 설날은 내일이래요.”사실 어릴 적 우리의 설날도 까치설날부터 시작되었다. 엄마를 따라 방앗간에 가게 되면 팔 길이보다도 더 긴 가래떡 하나를 선사받아 기다림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는 전을 부치는 할머니와 어머니 곁을 번갈아 알짱거리며 한 점씩 얻어먹는 재미와 맛을 지금 어디 고향에서나 맛볼 수 있을까.
성탄절의 캐럴송과 같이 설날에 자주 불러졌던 윤극영 님의 동요‘설날’에는 신기하게도‘까치설날’이 등장한다. 설을 주제로 하는 그림에 까치가 자주 등장하고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도 있다 보니 까치설날을 진짜 설날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까치설날은 윤극영 님의 동요가 나오기까지 우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던 말이다. 다만 예부터‘아치설’또는‘아찬설’은 있었는데, 아치와 아찬은 작은(小)을 뜻하고 이것의 경기도 사투리가 까치다. 즉 음력 정월 초하루가 큰 설이고 그 전날인 섣달그믐이 아치설(작은설)인데 윤극영 님의 동요에서 아치설날이 까치설날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까치설날’을 어린아이의 말로 설날의 전날 곧 섣달 그믐날을 이르는 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은 까치가 울기 때문에 없던 손님이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되면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들게고 유독 경계심이 많은 까치들은 낯선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누구네 손님인지 울음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까치의 환호를 받으며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의 아침상에는 세시음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김 뿌옇게 나며 김 가루 송송 뿌려진 떡국이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대면하여 가지런히 놓인다.
그런데 왜 세시음식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자리에 떡국을 포진해 놓았을까? 설날은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조상들은 묵은해를 보내고 엄숙하고 청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함이 옳다 여겨 새하얗고 깨끗한 흰 떡국을 끓여 먹게 되었다 한다.
또한 요즘은 가래떡을 첨단화된 기계에서 대량으로 뽑아내지만 예전에는 남정네들이 마당에 안반을 두고 멥쌀을 떡메로 찰 지게 친 후 길게 늘이면 가래떡이 되었다. 이렇게 길게 늘어진 가래떡처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떡국 속에 담겨 있고, 요즘은 가래떡을 비스듬히 타원 모양으로 자르지만 옛날 왕가에서는 동그랗게 잘라 그 모양이 마치 화폐인 엽전과도 같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며 돈도 잘 벌고 풍족한 삶이 깃들기를 염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묻고 싶다. 떡국을 한 그릇 먹었으니 나이가 한 살 더 드는 것인지, 나이가 들었으니 떡국을 먹는지 말이다. 굳이 나의 대답을 하자면 없어서 못 먹는다. 추억에 소환되어 떡메 치는 곁에서 한 덩이 얻어먹고도 싶고, 떡 방앗간에서 조금이라도 오래오래 먹으려고 길게 늘려가며 떡 가래도 실컷 먹고 싶은 마음 금할 길 없다.
출애굽하여 광야교회를 형성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하여 가나안을 향한 동선을 가졌다. 그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등대, 분향단, 휘장, 법궤, 속죄소와 더불어 진설병상이 있었다. 떡 상이라고도 하는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여있는 상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12개의 떡이 여섯 개씩 두 줄로 진설되었고, 대접과 숟가락, 병과 잔이 함께 놓여있었다. 그리고 진설병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뀌어졌다(레 24:5-8).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레위기 24:5-8)
떡 상 위의 떡은 항상 신선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그 위에 유향을 두어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진설병은 매 인식일마다 교체되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했고(출 25:30), 물려낸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어 영양과 에너지를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직임을 감당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레위기 24:9)
성소에 진설된 떡은 하나님께 드림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양식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 떡을 이스라엘을 백성을 위한 것으로 약속 하셨는데, 떡 상에 놓인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출 25:30)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함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떡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떡 집’이라는 뜻을 지닌‘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
인제 떡국 먹는 설날이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의 나이도 365일의 무게만큼 마셔야 한다. 어느 혹자의 말처럼 나이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한다. 이번 설날에는 떡국 떡에만 흰 옷을 입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고 빛난 흰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온 가족이 말씀의 밥상에 둘러앉아 살아있는 떡이요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진설해 주신 말씀의 떡국을 포식해 보자. 그래서 이 땅에서만 한정된 가족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족으로도 떡국 물보다 진함으로 결연해보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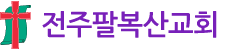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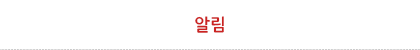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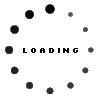
댓글0개